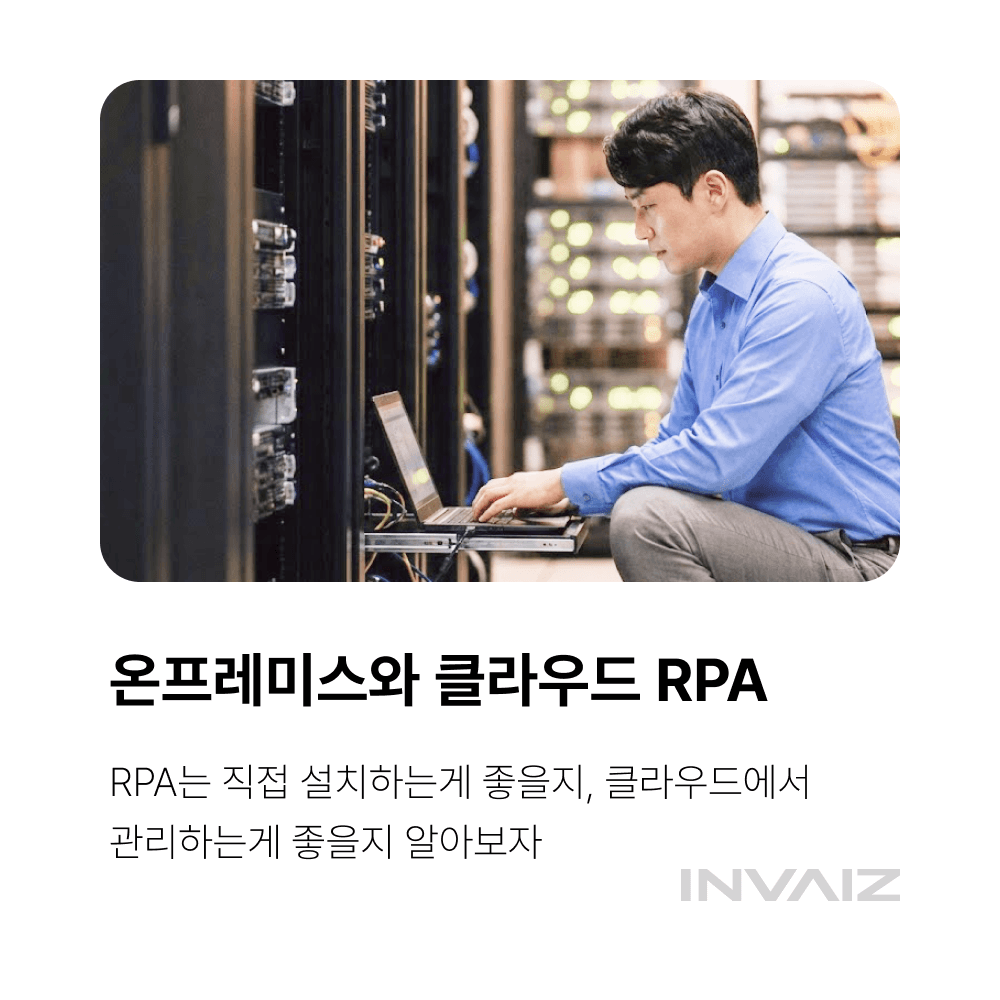망하기 일보직전의 대한민국 제조업
2025년 8월 13일
4개월전, Kurzgesagt 유튜브에 ‘South Korea is Over, 대한민국은 끝났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1337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유튜브를 자주 보는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접했을 법하다. 그렇다. 한국은 많은 위기에 처해있다. 그중 특히 국내 제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해, 내가 현장에서 느낀 위기와 경험 그리고 통계들을 함께 바라보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제조업은 끝났다.
4개월전, Kurzgesagt 유튜브에 ‘South Korea is Over, 대한민국은 끝났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1337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유튜브를 자주 보는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접했을 법하다. 그렇다. 한국은 많은 위기에 처해있다. 그중 특히 국내 제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해, 내가 현장에서 느낀 위기와 경험 그리고 통계들을 함께 바라보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 바쁘다면 알짜배기만이라도 !
제조 기반 붕괴 조짐: 2024년 제조업체 5만 6천 개 폐업
인구 구조 악화: 출산율 0.72명, 2060년 인구 30% 감소·65세 이상 절반 육박 전망
중국의 전략적 저가 공세로 기존 제조산업 붕괴 위기
내수와 생산 체력 동반 하락: 대기업 의존·임금 격차·인구 감소로 소비·생산 모두 위축
디지털 전환 시급: 평균 DX 단계 2.2, 36%는 추진 전 단계, AI 도입률 14.6%
이미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24년에만 5만 6천개의 제조업체가 폐업을 했다.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6%로 OECD 평균(15.8%)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아일랜드(31.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전체 수출의 83.5%가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GDP 대비 총수출 비중도 44.4%로 OECD 평균 15.8%를 크게 웃돈다. 이렇게 제조와 수출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제조업의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뿌리 산업이라 불리는 주물, 금형 업체는 연 5~700개씩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친한 대표님과 오랜만에 연락하여 안부를 물었었다. 그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말은 자신이 속해있는 산단에 업체가 10개 쯤 있었는데, 7개가 폐업하여 3개만 남은 상황이고 자신 또한 공장과 자재들을 처분하기 위해 매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인바이즈도 24년에 여러가지 이유들이 겹쳐 제조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제조원가와 인건비의 상승, 저가 제품의 가격 공세 등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하지만 어렸을 때 부터 제조업을 하는 가정에서 자란 나는 이 문제가 더 큰 구조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시장이 흔들린다.
중국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우는 중국은 여전히 저렴한 인건비와 저렴한 원자재를 통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 70%가 중국의 저가공세 영향권에 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판매단가 하락(52.4%), 내수시장 거래 감소(46.2%)로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중국은 정부주도로 공급과잉을 만들고, 모든 제조분야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과거 한국이 저렴한 인건비와 높은 노동생산성으로 경공업부터 조선업까지 일본의 점유율을 가져왔던 것 처럼, 중국이 한국의 점유율을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저가공세는 정부 보조금을 통한 전략적 덤핑의 결과다. 로디엄그룹 분석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주요 산업체에 제공한 세제 혜택은 2018~2022년 연평균 29%씩 증가하여 2022년 한 해만 1,850억 달러(약 250조원)에 달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CATL(38%), BYD(17%), CALB(4%) 등 중국 3사가 전체 시장의 약 60%를 장악한 것도 정부의 집중적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다. 중국은 거대한 소비 시장을 내세우지만, 경제 구조적으로 소비가 약해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해봤는데요.

사진(인바이즈 Grid Pro 제품의 금형과 사출기의 사출작업)
인바이즈의 초기 생산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었는데, 국내 생산비용이 중국 생산비용 대비 2배~3배 정도 비쌌었다. 3년 정도 국내에서 생산을 하였는데, 판매가 대비 원가 비율이 너무 높아 마진이 안나오는 구조가 되어버렸고 중국 생산으로 방향을 바꾸었었다. 이 결정 또한 오래가지는 못했는데, 결국 국내에서 설계, 판매가 이루어지다보니 중국 경쟁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니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현장에서 내가 느꼈던 가장 큰 제조업 몰락 중 하나는 전자 계열이었다. PCB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만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마우스 제품을 설계하는 일을 업체에게 맡기게 되었다. 설계는 큰 어려움 없이 끝냈지만, 업체는 펌웨어 기술자가 없어서 중국에 자문을 받으러 갔었다. 그때 당시 들었던 말은 “한국에 PCB 시장이 다 죽어서 이젠 중국이 훨씬 잘해요.” 였다. 중소 PCB 업체는 한국에서 멸종이 되어버렸다고 느낀 순간이었다.
인바이즈와 창업 초기부터 약 4년간 함께 PCB 일을 함께 했던 파트너사 또한 펌웨어 개발자가 없어 대표가 모든 일을 다 했었다. 그 당시 나는 “펌웨어 개발자를 뽑으면 안되나요?”라고 물었었고, 돌아왔던 대답은 “대기업에 있는 인력을 빼와야만 해요. 신입은 구경도 못합니다.”였다.
한국의 지속적인 내수부진의 악순환
높아진 인건비가 제조업체의 원가 경쟁력을 압박한다. 지난 5년간 한국 제조업의 시간당 인건비는 25% 이상 상승했지만 중소기업은 이를 제품 가격에 온전히 전가하기 어려워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2.4배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들의 소비 여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소득 양극화는 내수 시장을 위축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저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음에도 소득 자체가 줄어들면 소비가 급감하며, 중산층 이하 계층의 구매력 감소가 내수 전반을 잠식한다. 여기에 인구구조 변화가 구조적 수요 축소로 이어진다. 2020년을 정점으로 한국 인구는 최근 3년간 50만 명 감소했고, 2030년 생산가능인구는 3,763만 명에서 3,44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고령인구 비중이 20%에서 40%로 급증하면 전체 소비 수요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높아진 인건비, 임금 격차, 소득 양극화, 인구 감소라는 복합 요인이 맞물리며 내수 시장은 제조업의 마지막 안전핀 역할마저 상실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심지어 대기업마저 한국을 탈출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으니, 얼마나 더 수렁으로 빠질지 가늠이 되질 않는다.
독일과 일본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과거 독일과 일본도 한국처럼 ‘저렴한 인건비+높은 생산성’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 1960년대 독일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은 미국의 65% 수준이었고, 1970년대 일본은 미국 대비 50% 이하의 저가경쟁력을 보였다. 그러나 1970~80년대 위기(석유쇼크·플라자 합의)로 두 나라 모두 인건비와 원가가 빠르게 상승하며 저가 전략이 불가능해졌다.
독일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자동화·디지털화를 통해 원가구조를 혁신했다. 1996~2016년 산업용 로봇 설치량을 70% 이상 확대해 2020년 자동화율 35%를 달성했고, 스마트공장 파일럿 250여 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생산성은 2010~2018년 연평균 2%씩 성장했다. 동시에 ‘Dual System 직업교육’에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연간 5만 명 이상 공급했다.
일본은 1985년 엔화 절상 이후 토요타 주도의 ‘린 생산 방식’으로 공정 효율을 극대화했다. Kanban 시스템 도입으로 재고비용을 30% 절감했고, 공정 사이클타임을 20% 단축하며 불량률을 50% 이상 낮추는 성과를 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는 공급망 강인화(BCP 의무화)와 2021년 디지털청 설립으로 AI·IoT 기반 스마트 제조를 가속해 2024년 반도체 수출 세계 1위를 재탈환했다.
이처럼 독일과 일본은 저가 경쟁력 상실 시점에 자동화·디지털 전환, 공정 혁신, 인력 재교육이라는 구조적 전환을 단행했다. 한국도 이제 단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초격차 기술 개발, 제조와 서비스 융·복합,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의 제조업 바껴야만 산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여전히 평균 2.2단계(기반조성)에 머물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36%가 0단계 (추진 이전)라고 응답하였다. 데이터 활용 역량은 극히 낮아 디지털 전환의 핵심 걸림돌이며, AI 도입률은 14.6%로 필요와 실천의 간극이 매우 크다.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지만, 기업의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와 인식 전환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중국의 저가 공세가 더 거칠어지는 지금, 이 문제를 남의 집 불처럼 바라보면 우리에겐 가격 외의 방어선이 사라진다. 그래서 선택지는 결국 가격이 아니라 생산성·품질·속도에서 승부를 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다. 산업연구원도 “공급망 위치·공정 특성·수요시장·데이터 가용성”을 반영한 맞춤 전략 위에, 디지털 기술 역량·전문인력·공정혁신·BM 창출을 우선 강화하라고 제언한다. 전환 수준이 낮은 산업일수록 실증 R&D와 컨설팅 같은 ‘사람과 역량’ 투입이 급하다.
독일의 뛰어난 등대공장(Lighthouse)들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완벽하게 해냈다. 등대공장의 제조혁신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비중의 44.8%가 설비의 디지털화 또는 자동화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모든 기업에는 이미 프로세스가 있다. “우리 회사는 공정이 복잡해서 안 돼”라는 말 대신, 어떤 부분을 프로세스로 자동화할 수 있는지를 묻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은 사람이 공정을 메꾸는 과거의 제조업이 아닌, 사람을 지켜내는 프로세스가 확립된 대한민국 제조업이 되었으면 한다.
주요 인용 출처
김종기 외, 「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혁신 활성화를 위한 연구」, KIET 산업경제, 2024.
세계경제포럼(WEF), “Lighthouse Factories 2019–2023”, WEF 보고서, 2023.
Rodium Group, “China Industrial Subsidies Analysis”, 2025.
한국통계청(KOSIS), “제조업 GDP 대비 비중 및 수출입 통계”, 2025.
OECD, “Economic Surveys: Germany 1980”, OECD, 1980.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International Trends in Productivity and Labor Costs”, Monthly Labor Review, 1981–1982.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2025년 5호: 최근 제조업 고용 감소와 주도 산업」, 2025.
통계청, “2025년 6월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 2025.
로디움그룹, “Global Industrial Subsidies 2018–2022”, 2024.
대한상공회의소, “중국 저가공세 영향 조사”, 2025.
RPA, 시스템 자동화
시작하기 막막하신가요?
우리 기업에 딱 맞는 자동화를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인바이즈를 찾아주세요.
다른 인사이트도 찾아보세요.
더 다양한 인사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